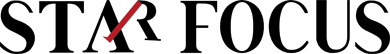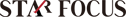'그래도'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아름다웠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전세계 소녀들의 워너비 스타가 된 그녀는 1930년대 뉴욕 복고풍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녀의 화려한 모습을 만끽하며 여배우들을 활용하는 데에 독보적인 우디 앨런 감독임을 다시 느꼈다. 그래서 영화 '카페 소사이어티'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도'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아름다웠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전세계 소녀들의 워너비 스타가 된 그녀는 1930년대 뉴욕 복고풍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녀의 화려한 모습을 만끽하며 여배우들을 활용하는 데에 독보적인 우디 앨런 감독임을 다시 느꼈다. 그래서 영화 '카페 소사이어티'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다. 딱 보기에도 뉴요커라고 하기에 애매한 바비(제시 아이젠버그 분)는 부와 명예를 꿈꾸며 헐리우드에서 일을 시작한다. 화술은 그럭저럭 괜찮을지 몰라도 그는 여러모로 어리버리하다. 자신의 큰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무실에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기다리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게 조금씩 이 바닥의 생리를 익혀가는 그는 보니(크리스틴 스튜어트 분)를 만나 한눈에 반한다. 우디 앨런의 팬이라면 좋아할 법한 열광적인 말솜씨로 어떻게든 보니의 환심을 사려 애쓰는 바비. 같은 남자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다.
다행히 보니도 바비를 좋아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애인이 있다. 유부남 재력가인 필(스티븐 카렐 분)이 아내와 헤어지고 너에게 가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것. 필은 극 초반에 아내와 보니 사이에서 망설이지만 결국 보니를 택한다. 바비 역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베로니카(블레이크 라이블리 분)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결혼한다. 그렇게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두 사람.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서로 마주친다.
영화의 메인플롯은 바비와 보니의 관계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서브플롯 가운데 하나인 에블린(사라 레닉 분)의 이야기다. 바비의 누나인 에블린은 '신경 쇠약 직전의' 교사로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남편(레너드 역)과 항상 티격태격한다. 옆집에 사 최악의 이웃은 안 그래도 신경질적인 그녀를 더 열 받게 만드는 '공공의 적'이다. 그런 어느 날, 심한 편두통으로 누워 있는 에블린을 보고 레너드가 "지금 아내가 아파서 그러는데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시겠소?"라며 부탁한다. 안하무인인 이 남자는 오히려 자신의 권리 운운하며 더 악질적으로 대응한다. 이 일을 계기로 에블린은 갱스터 오빠인 벤(코리 스톨 분)에게 하소연 한다. 월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한 가지다. 극 중에서도 표적을 삼은 사람을 총으로 쏴서 땅에 묻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에블린의 이웃남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우디 앨런의 영화답게 이들은 이 부조리한 죽음을 놓고 설전을 벌인다. 레너드는 도덕적 딜레마를 운운하며 "우리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고 성토한다. 그래도 아주 조금은 죄책감을 느끼던 에블린은 남편의 반응 때문에 "그런 놈은 죽어도 싸다"며 "나는 겁만 주라고 했을 뿐이었다"고 책임회피 한다. 일을 벌인 벤은 "주먹을 써야 알아듣는 작자들이 있지"라며 행위의 정당성에 무게를 둔다.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에서 본 우디 앨런의 전매특허인 이 토론이 '카페 소사이어티'에서는 군더더기로 작용한다. 분위기 전환용으론 적합하겠지만 플롯의 개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사진출처=CGV아트하우스>
<사진출처=CGV아트하우스>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는 우디 앨런이 잘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가득하다고 극찬한다. 유대인, 뉴욕, 재즈, 복고, 로맨스... 그런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도 뚜렷하게 와 닿는 것이 없다. 관객의 관심사는 우디 앨런의 새로운 뮤즈로 등극한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변신이다. 그녀가 제시 아이젠버그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그 달달한 케미에 집중한다. 이 젊은 연인은 제법 구미를 당긴다. 하지만 상투적인 결말 때문에 거기까지다. 코미디와 풍자도 전작에 비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덜하다. 무게감을 많이 비워낸 시도로 보인다. 그 결과 더 '대중적'이다.
이 삼각관계에 한 축을 담당하는 불륜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비와 보니가 느끼는 씁쓸한 감정으로 폭을 넓혀가며 작품을 마무리짓는 '근거'가 된다. 또 다른 선택에 대한 미련으로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잠시 잊고 다른 생각을 하는 바비와 보니. 이런 류의 식상한 감정선은 이미 너무 많이 봤고, 이미 너무 많은 감독들이 훌륭하게 해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메릴 스트립의 명연기가 돋보였던 비 오는 장면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굳이 '우디 앨런'이 아니었어도 되었을 이야기였다. 더구나 올해에는 재즈 뮤지션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연달아 개봉했다. 쳇 베이커의 삶을 다룬 영화 '본 투 비 블루'나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 '마일스'까지. 재즈가 흐르는 30년대 뉴욕 풍경에 만족하기에 이미 보는 이들의 기대치는 훨씬 높아졌다. 비주얼적인 요소들만 놓고 봐도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화려함, 세련미와 비교된다. 우디 앨런은 무엇이 그토록 급했기에 이렇게 서둘렀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는다.
고경태 kkt1343@naver.com